■ 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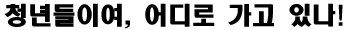
월간 【십대들의 쪽지】가 93년 12월부터 94년 1월까지 중고생 3천 1백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들의 인생관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31%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장해 가장 중요한 생활상으로 꼽고 있다.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응답자는 11.2% 였다. 반면
자신의 취미에 맞는 생활(27.4%),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13.3%),
한가롭고 마음 편한 생활(13.3%), 높은 사회적 지위(2.6%)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그 동안 우려해 온 청소년들의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신보 1994.3.19>
 오늘의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번
커버스토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개인주의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되돌아봅니다.
세계화! 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향해
노력합니까? 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 여유가 없어져 버렸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 버렸습니다. 함께 하는 삶을 귀찮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 역시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한가지의
수단으로 뒤바꿔져 버린 모습들입니다. 대학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번
커버스토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개인주의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되돌아봅니다.
세계화! 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향해
노력합니까? 무한 경쟁의 파고 속에서 여유가 없어져 버렸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 버렸습니다. 함께 하는 삶을 귀찮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 역시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한가지의
수단으로 뒤바꿔져 버린 모습들입니다. 대학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여,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학생, 이 세 글자만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 학급에 보통 2∼3명이 대학에 진학했다던 시절,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유신정권 시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시절의
대학생들, 그들은 실로 특권층이었을 것이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회적 '반칙'은 대학생 뺏지 하나 만으로 그대로
눈감아 주었고 학생증 하나면 술값 정도는 외상이던 시절. 그들은
최소한 심적으로는 여유로웠을 것이고 열등감 따위에 시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남대학교 체육학과 이모 교수(42세)는
자신의 대학 시절을 회상한다. "공부라는 것에 얽매였던 기억은 없다.
고작 대학원 진학을 위해 골머리를 앓던 기억은 있다. 시간이 많아 주로
책을 읽었다. 학기 중이라도 산에는 자주 갔는데 한 번 가면 보통 1주일
걸렸다. 최소한 지리산 일 주라도 해야 '산 타고 왔다'고 말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학기 중에 일 주일씩이나 산에
다녀온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못 가게 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스스로 여유가 없다. 밀린 학과 공부와 취업 준비를
위해서 수학여행도 '당연히' 포기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 교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사회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다. 특히
교련 과목은 항상 불만의 대상이었다. 학점에 연연할 필요도 없었고
자연히 교련시간은 고의로 빼먹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지만... 그래도 그 땐 꽤나 고민하고 행동한 것이다. 좀 짓궂은
친구들은 교련 수업을 아예 방해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꼬박꼬박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라 여겼다." 초저녁부터 막걸리 집은 만원이었다고 한다. "지금
술값 생각하면 그 땐 술값도 아니었다. 안주라야 고작 김치와 오댕
국물이었지만... 지금 학교주변 호프집이나 카페에 가서 보면 비싼
안주로 쫙 깔려 있는 게 우리 때와 너무 다르다. 우린 그 때 부담 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돈이야 그 날 있는 사람이 내면 됐고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설사 돈이 없더라도 학생증만 내 맡기면 만사 O.K였다."
지금의 현실에 이 교수처럼 대학 생활을 한다면 학사경고는 물론이고
취업은 꿈도 못 꿀 것 같다. 하지만 그 땐 그게 통용됐다고 한다. 최소한
대학생이란 신분은 사회적으로 쉽게 통용되는 보증 수표였고, 그들
나름대로 '룰(rule)'을 지켜 나갔다고 한다.
20년이 흐른 지금 대학생의 숫자는 무려 백만 명이 넘는다. 집집마다
대학생이 있고 두 셋 있는 집도 쉽게 발견한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특이하다. 대학은 '정규교육'이 되어 버렸다. 옛날 같이
무단 횡단하다 교통 경찰에 걸려 "나 대학생인데..." 하면 "나도 대학
다니다 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요즘이다. 당연히 대학의 문화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대학생인 사회,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게다가 졸업 후 취업의 문은 너무나도 좁다. 여유가
없다. 산에 갈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워야 마음이 편하다.
대학에선 1,2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측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 학이 주최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요구에 총학생회가
따른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연일 만원이다. 중·고생이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은 사라졌다. 대학마다 I.C 카드로 출입을 통제한다.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증거다. 어학 학원이나 컴퓨터 학원은 그칠 줄
모르고 늘어난다. 그 만큼의 수요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변화가
심한 곳은 동아리다.
봉사 동아리나 학술 동아리에 신입생이 가입한다는 건 꽤나 고무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운동권 동아리는 말할 것도 없다. 조선대학교 모 학술
동아리 관계자는 도대체 힘이 안 난다고 말한다. "스스로 걸어오는
신입생은 하나도 없다. 대개가 인맥을 통해 체면 삼아 오는 경우인데
끝까지 열심히 하는 신입생은 드물다. 우리 동아리도 뭔가 변화를
꾀해야 할 것 같다." 변화하지 않는 동아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 변화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물론 취업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들의 취업 열기가 뜨거워지자 재빨리 변신하여
성공하는 동아리들은 주로 어학 동아리나 컴퓨터 동아리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영어회화 동아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컴퓨터
동아리도 증가 추세에 있다. 경영대에 다닌다는 한 학생(94학번)은
동아리에 만족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영어회화 동아리도 공부는
제쳐두고 주로 놀기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입을 꺼렸다. 하지만
가입한 친구를 통해 다르다는 걸 알고 가입했다.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고 돈들이지 않고 Native-Speaker와 이야기할 수 있어 좋다." 놀기만
하는 동아리는 싫어한다는 것이다.
놀기만 하는 동아리가 싫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따로 논다는 것이다. "동아리에서는 스터디만 해요. 여가가
생기면 주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다녀요. 그래야 편해요. 얽매이는
느낌도 없고..." 아까만 해도 동아리에 만족한다고 했던 여학생이다.
동아리에는 만족하지만 얽매이기는 죽어도 싫다고 한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동아리 중에서도 필요한 빼 먹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그들을 탓하는 것도 무리인 셈이다.
대학가에 흐르는, 아니 범람하는 개인주의 물결, 그 물결 속에 기독
청년들 역시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곳이 사실이다. 대학가엔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보인다. 그들이 '행함 없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로
듣는다. '대학' 이라는 가장 중요한 추수터를 위해 온 교회가 힘써야 할
가을이 아닌가 생각한다.
취재 : 부질없는 소리 편집부
 관련기사 관련기사
|

![]()
![]()
![]()